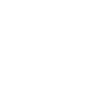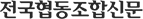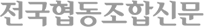[村스러운 걷기 여행] 전북 부안 변산마실길 3코스
책 수만권 쌓인 듯한 채석강 암반길 청량한 겨울바다 만끽하며 걷기 시작
격포해변·낙조 명소 ‘해넘이 채화대’ 지나 대나무 우거진 작은 어촌 죽막골에 도착
뱃사람 안녕 기원하던 수성당을 거쳐
붉은 바위·자갈 가득한 적벽강 걸으면 걷기 여정의 종착점 성천항에 다다라
해넘이 구경은 꼭 이맘때 하게 된다. 언제고 항상 해는 지지만, 부지런히 걸어온 한해의 끝 무렵엔 유달리 석양에 눈길이 머문다. 전북 부안의 변산마실길 3코스에서 그 낙조(落照)를 볼 수 있는 구간을 걷는다. 세월이 쌓아놓은 서해 절벽 너머로, 하얗게 밀려오는 너울을 보며 걷는 길. 사시사철 아름다운 곳이다. 다만 바위에 부서지는 이곳의 파도는 찬 바람이 세찰 때 그 풍광이 더 깊다.

채석강 절벽 아래 겨울바다 바라보며
하얀 모래사장도 짙은 빛깔의 갯벌도, 모두 그 바다 나름의 매력이 있다. 다만 바위를 거닐며 마주하는 바다는 조금은 드문 풍경이기에 한층 인상적이다. 울퉁불퉁한 암반의 표면을 하얀 포말이 미끄러져 오르고, 이내 쓸려나가는 물살 위로 새 물머리가 다시 덮쳐 오른다. 바위에 부딪혀 튀는 물보라가 높다란 하늘 아래 더없이 청량하다. 겨울바다와 잘 어울리는 이곳은 길의 시작점인 채석강이다.
채석강은 마치 ‘수만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모습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변산반도의 서쪽 끝에 자리한 1.5㎞ 길이의 해안지대로, 오랜 세월 바닷물에 침식돼 켜켜이 쌓인 암석의 층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그 기묘한 층암절벽을 오른편에 세우고, 몰아치는 파도를 왼편으로 받으며 걷는다. 채석강의 지형은 홀로 서해 쪽으로 동그랗게 도드라져 있다. 다른 손길 없이 하늘·바다·바위만 자리한 길. 호젓하게 걷기에 좋고, 한적하게 잠시 머물러 있기에도 좋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의 소란이 너른 바다 위 공기를 가득히 메운다.

다양한 빛깔의 서해바다
채석강의 암반길 끝엔 격포해변이 나온다. 썰물 때 찾은 이곳은 모래밭을 품은 해수욕장일 테지만, 밀물일 때 찾았다면 온통 바닷물이 출렁이는 망망대해의 일부로 변모한다. 아직은 물이 빠져 있어 드러난 격포의 사주(沙洲). 그 위를 걷는 길에 어쩐지 겨울햇살이 조금 더 포근하다.
격포해변을 뒤로하고선 죽막골이라는 작은 바다마을에 닿는다. 죽막골은 원래 대막골이라고 불렸던 곳이다. 마을주민의 말에 따르면 사방에 신우대(대나무의 일종)가 많아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고.
“우리 마을에선 여그 옆에 수성당이 유명하지. 옛날에 바닷사람덜 무사하라고 치성 올리던 곳인디, 지금도 우리나라 말고도 중국·일본 무속인들이 때마다 모여들더라고.”
수성당은 죽막골에서도 높은 절벽 위, 낭떠러지 끝에 자리했다. 서해를 다스리는 개양할머니와 그의 딸 여덟자매를 모신 당집으로, 1801년 처음 들어섰으나 지금 건물은 1996년에 다시 세워졌단다. 오랜 세월의 치성 탓일까. 벼랑 위에서 바라본 서해엔 실로 남다른 위용이 흐른다. 먼저 와 있던 무속인들이 내는 북과 징소리를 가만히 듣다, 새삼 스산해진 주변 기운에 슬며시 일어나 걸음을 옮긴다.

해안절벽을 따라 걷는 길 그리고 해넘이
수성당을 나와선 적벽강 절벽 위를 따라 걷는다. 적벽강은 채석강과 마찬가지로 바위·단애로 이뤄진 2㎞ 길이의 해안지대다. 암석과 자갈에 붉은빛이 감도는 게 특징. 채석강에서 썰물이었던 바다는 적벽강에 이르니 밀물로 바뀌었다. 물이 차는 기세 때문인지, 적벽강의 바다가 북쪽을 향한 탓인지, 얼마간 스치던 겨울바람이 여기선 한층 더 드세게 분다.
적벽강 너머 성천항까지는 계속 해안절벽 위를 걷는 길이다. 바다에 바짝 붙었던 길이 이내 멀어졌다가, 다시 바다로 가까워지길 반복하는 오솔길.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와 저 멀리 동동 섬들을 띄운 수평선이 번갈아 시야에 걸린다. 그렇게 숲과 들판을 거닐다보면 이 길의 종착점인 성천항에 닿는다.
서해에 자리한 이 코스는 대부분 위치에서 떨어지는 해를 배웅할 수 있다. 다만 격포해변 인근에 마련된 ‘해넘이 채화대’에선 채석강 절벽 옆으로 떨어지는 너른 바다 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다시 돌아간 격포해변엔 거센 파도가 백사장을 뒤덮고 있다. 왼쪽으로 보이는 채석강 또한 바다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시작과 달라진 끝 무렵의 어스레한 풍경. 바람은 더 차갑게 불어오지만 두눈은 수평선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석양이 일구는 붉은 결실을 가만히 그리고 고요히 마음에 담는다.
부안=이현진, 사진=김덕영 기자 abc@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