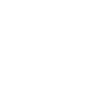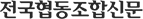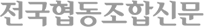와이너리 기행 (14)경북 상주 젤코바
와인 연구 40년…직접 재배한 머루로 양조
오크통서 2차 숙성 거쳐 완성까지 최대 5년
신맛·떫은맛 균형 이루면서 한층 부드러워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과실 가운데 와인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와인과 가장 비슷한 품질을 낼 수 있는 것이 머루다. 경북 상주에는 이 머루를 양조에 가장 적합하게 재배해 와인을 만드는 곳이 있다. 평생을 술과 함께 살아온 술 전문가가 운영하는 와이너리 젤코바다.
경북 상주의 남부, 한쪽으로는 넓은 논이 끝없이 펼쳐지고 반대쪽으로는 높고 낮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청리면 청하리에 젤코바 와이너리가 자리 잡고 있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맞은편에 펼쳐진 4600㎡(약 1400평) 규모의 머루밭이 보인다. 강창석 대표는 이곳에서 직접 재배한 머루로 와인을 만든다.
40년 양조 전문가가 만들다
강 대표는 인생을 와인과 함께 보낸 사람이다. 20대였던 1970년대말, 우리나라 와인 양조의 시초인 ‘파라다이스’에서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했다. 1965년 양곡관리법이 발효되면서 쌀로 술을 빚을 수 없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시초가 <파라다이스 애플와인>이었다. 마침 친구 삼촌이 파라다이스에서 공장장을 지내고 있었고, 그 인연으로 와인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와인과의 인연은 1980년대초 대구에 있는 소주회사 ‘금복주’로 이어졌다. 여기서도 강 대표는 와인과 사과주 만드는 일을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와인과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대구보건대학교 와인커피과에서 와인 양조 강의를 하고 경북도농업기술원·영천와인교실에서도 강의를 했다.
“계속 강의만 하다보니 어느 순간 남을 가르치지만 말고 내 와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와이너리를 세우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와인 이름 ‘젤코바’는 느티나무라는 뜻의 영어로, 강 대표 고향마을의 당산나무에서 따온 것이다.
양조 전문가인 만큼 와인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문제는 원료였다.
“와인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도를 생식용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양조용으로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양조용은 알이 작고 껍질이 두꺼우며 씨가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양조용 포도를 재배해서 사용하자 했죠.”
처음에는 유럽의 양조용 포도 품종인 <샤도네이>와 <리슬링> 등을 심었는데 우리나라의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몇번의 시행착오 끝에 결국 와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머루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젤코바 머루와인의 역사가 시작됐다.

5년 숙성한 머루와 캠벨 와인
강 대표가 와인을 만드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다. 수확한 머루를 으깬 뒤 효모를 넣고 25℃ 안팎에서 발효시키고 7∼10일 지나면 착즙해 탱크로 옮겨 숙성한다. 탱크 숙성이 끝나면 다시 오크통 숙성을 거치고 청징한 후 병입한다.
특별할 것 없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젤코바 와인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시간이다. 시간의 힘은 밭에서부터 시작된다. 강 대표는 머루가 한참 물이 올라 통통해졌을 때가 아니라 꼭지가 다 말라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한다. 그래야 당도도 충분히 올라가고 껍질도 더 두꺼워져 와인 만들기에 더욱 적합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숙성 과정이다. 발효가 끝난 뒤 탱크에 들어간 와인은 지하 숙성고에서 2∼3년을 보낸다. 대개 레드와인이 20℃ 정도에서 숙성되는 것에 비해 숙성온도도 13∼14℃까지 떨어뜨린다. 저온에서 오랫동안 숙성해야 향이 잘 표현되기 때문이다. 머루 특유의 강한 신맛을 줄이고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이 과정에서 2차 발효를 유도하기도 한다. 착즙해 숙성에 들어간 와인에 잔당이 있으면 발효가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를 2차 발효라고 한다. 강 대표는 의도적으로 이 과정을 유도해 머루의 거친 신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탱크 숙성이 끝난 와인은 2차 숙성에 들어간다. 오크통 숙성이다. 오크통 안에서 최소 1년을 더 보내고 나서야 와인은 병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밭에서 끝물 수확한 머루가 와인의 모습을 갖춘 뒤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4∼5년은 걸리는 셈이다.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이는 이유를 강 대표는 맛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래 숙성시킬수록 머루 특유의 신맛과 떫은맛이 균형을 이루고 부드러워져 훨씬 우수한 품질의 와인이 된다”는 것.
오랜 시간을 거쳐 나온 <젤코바 프리미엄 드라이>는 진한 장밋빛으로 전형적인 레드와인 색을 보인다. 입에 머금으면 기분 좋은 신맛에 뒤이어 삼나무 향 같은 씁쓸한 향이 확 들어온다. 라벨을 보지 않고 마셔본 사람들은 종종 프랑스 론 지방의 유명 와인 품종인 <그르나슈>로 만든 와인이냐고 묻기도 한다고 강 대표는 설명한다. <젤코바 프리미엄 드라이> 2013년산은 지난해 한국와인대상에서 골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머루 100%로 만든 <젤코바 프리미엄 드라이>에 비해 좀더 가벼운 느낌의 와인도 있다. 머루와 <MBA(머루포도)>를 섞어 만든 <젤코바 스페셜>이다. “씁쓸한 맛 뒤에 농축돼 걸쭉한 밀키한 향이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머루가 느껴지는 이 와인은 와인 초보자용으로 추천할 만하다”는 것이 최정욱 소믈리에의 평이다.
<캠벨얼리>로 만든 와인도 있다. 2015년 당시 상주의 포도농사가 워낙 잘돼서 미처 따내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나무에 매달린 채 남은 유기농 포도가 있었는데 그걸 가져다 와인을 만든 것이다. 생식용으로 판매하기에는 너무 말라버렸지만 와인용으로는 적합했던 것이다. <캠벨얼리>로 만든 와인은 오래 숙성하기 어렵다는 통설을 깨고 5년째 숙성한 뒤 최근에야 판매를 시작했다. <캠벨얼리> 특유의 달콤한 향 뒤에 신맛과 약간의 떫은맛이 이어지는 드라이한 맛이 반전이다.
취재협조=최정욱(소믈리에·오산대 외식사업과 교수)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