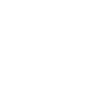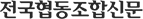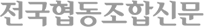[전국 방방곡곡 ‘탕’ 열전] 찬바람 불어오니 ( )도 끓는구나
충남 태안 꽃게탕
된장·소금 풀고 청양고추로 얼큰하게
체면 잊고 껍데기 구석구석 발라 냠냠
푹 익힌 게의 속살을 살살 발라 먹으면 그 감칠맛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중국 당나라 시인 이태백은 게를 먹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손에는 게 발을 들고 한손에는 술잔을 들고 주지(酒池) 속을 헤엄치고 있으면 일생 살아가는 데 무엇을 더 바라리오.”
게는 다 맛있지만, 지금은 꽃게가 제철이다. 여름에 산란기를 보내고 다시 오동통하게 살이 차오른 꽃게가 잡혀오는 때다. 꽃게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지금은 탕으로 먹어야 제맛이다. 얼큰한 꽃게탕 국물 한모금에 달짝지근한 꽃게살을 호로록 먹으면 추위로 얼었던 양볼에 온기가 퍼진다.
꽃게탕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은 꽃게 주산지 중 하나인 충남 태안 안면도다. 안면도 사람들에게 꽃게는 일상적인 음식 재료다. 집 앞 바다에 어망 쳤다 하면 잡히는 게 꽃게니, 꽃게탕·게국지 등 다양한 꽃게 향토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안면도에 가면 ‘거의 모든 식당에서 꽃게탕을 내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된 백반집부터 대형 횟집까지, 그 어디를 봐도 메뉴판엔 꽃게탕이 빠지지 않는다. 그중 ‘백사장항꽃게거리’에 있는 식당 ‘복음회관’을 찾았다.
“안면도 어느 식당에 가나 꽃게탕은 다 맛있어. 진짜여. 갓 잡은 싱싱한 꽃게로 만드니까.”
복음회관에서 23년째 일하는 유관순씨(68)가 냄비엔 꽃게탕 육수를, 바가지엔 아직 살아 꿈틀대는 꽃게를 담아서 나왔다. 육수와 살아 있는 꽃게를 따로 내오는 건 그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팔딱거리는 꽃게가 팔팔 끓는 육수 안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손님들이 두눈으로 봐야 더 기분 좋게, 맛있게 꽃게탕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꽃게가 빨갛게 익어가며 감칠맛을 뿜어대니, 이곳 꽃게탕 육수엔 특별한 양념이나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꽃게의 비린내를 잡아줄 된장과 볶은 소금 살짝 풀어 넣고 양파·대파·청양고추 등을 넣은 게 전부다. 암게 한마리를 반으로 툭 갈라보니 장(腸)과 살이 그득하다.
“봐봐, 장이 이렇게 차 있지. 초가을엔 암게가 삐쩍 말랐는데 논에 있는 벼 다 베었을 때 잡은 암게는 먹기 딱 좋아.”
손끝을 데건 말건, 모락모락 김이 나는 큼지막한 꽃게 조각을 집었다. 양손으로 다리 한쪽씩 잡고 몸통을 쫙 찢으니 하얀 살이 튀어나온다. 한입 베어 무니 탱글탱글한 살이 입으로 쏙 들어온다.
꽃게살을 맛보고 나면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진다. 그저 껍데기 구석구석 숨어 있는 살만 더 발라 먹을 수 있다면, 입가에 뭐가 묻든 손가락이 더러워지든 알 바 아니다.
뜨끈한 국물도 한술 떠먹지 않을 수 없다. 구수한 된장에 달큰한 꽃게 육수가 더해지니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다. 청양고추가 만들어낸 얼큰한 끝맛에 온몸의 긴장이 풀린다. 그 와중에도 보글보글 끓는 꽃게탕. 국물 맛은 더욱 깊어지고 꽃게 껍데기는 수북이 쌓여만 간다.
태안=김민지, 사진=김도웅 기자 vivid@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