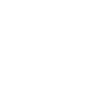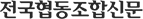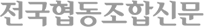[전국 방방곡곡 ‘탕’ 열전] 대청호 밀물새우탕
충청·전북 금강 유역서 별미 자리매김
기본양념만 넣어 맑고 소박한 맛 자랑
은은히 가을을 머금은 호반(湖畔)의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청호지만, 사실 이맘때 대청호를 방문할 이유는 따로 있다. 제철을 맞은 민물새우탕을 맛볼 수 있어서다.
충청도 사투리로 ‘새뱅이탕’으로도 불리는 민물새우탕은 충청과 전북지역에서 즐겨 먹는 음식으로, 충청도에선 대청호를 포함한 금강 유역에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많다. 일대에서 닭백숙이나 장어구이를 파는 식당마저도 민물새우탕을 곁들여 준다고 써 붙여 손님을 끌 정도로 민물새우탕은 유명한 지역 별미다.
“요즘이 딱 제철이에요. 새우살이 통통하게 오른 거 보이시죠?”
대전 동구에서 30년 넘게 영업 중인 ‘은골할먼네’ 김학란 사장(59)의 말이다. 자세히 보니, 새끼손가락 두마디만 한 새우는 두둑이 살이 올라 있는 데다가 배엔 연한 황금빛 알까지 그득그득 차 있어 과연 제철이란 걸 실감케 한다.
맛보지 않고 황금빛 알만 보고 있어도 흐뭇할 정도인데, 가격도 기특하다. 네사람이 먹을 만한 민물새우탕 대(大)자가 3만원. 주머니 가벼운 나들이객이라도 제철 미식을 즐기기엔 부담이 없다. 그러나 혹자는 궁금하기도 할 터다.

‘민물새우면 토하(土蝦), 옛날에는 임금님께 진상했다던 귀한 음식 아닌가? 토하로 이렇게 푸짐한 탕을 끓일 수도 있어?’
사실 이는 민물새우를 부르는 이름이 지역별로 다르고, 민물새우에도 종류가 있어 생긴 궁금증이기도 하다. 크기가 작은 민물새우 종류인 생이새우로 젓갈을 담그는 전남지역에서는 생이새우만 토하라고 부르고, 충청도와 일부 전북지역은 생이새우·줄새우·징거미새우 등 민물새우를 통틀어 토하나 새뱅이라고 부른다. 탕에는 가재처럼 생긴 징거미새우가 주로 들어가는데, 지금이 딱 막바지 어획철이란다. 다만 요즘에는 대청호가 아니라 충남 일부와 전라도 금강하굿둑에서 잡힌 것을 가져다가 쓰고 있다.
“맨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땐 대청호가 주요 산지여서 여기에 민물새우탕집이 생겼던 건데, 이제는 역으로 민물새우탕 때문에 대청호에 민물새우도 오고 손님들도 오게 됐죠.”
궁금증이 가셨다면 이젠 허기를 가실 차례. 버너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민물새우탕의 모양새는 소박하지만, 한숟가락 뜨는 순간 뜨끈한 국물을 홀홀 들이마시느라 정신이 없어진다. 탕에 들어간 것은 민물새우, 큼직하게 깍둑썰기한 호박과 제철 무와 미나리·쑥갓 정도인데 이리도 입맛을 당기게 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씹으면 입안에서 얼큰히 물 찬 새우살이 톡톡 터진다. 쫄깃쫄깃 차진 수제비도 건져 먹는 재미가 있다.
탕엔 조미료 없이 고춧가루와 마늘·소금 등 기본양념만 했을 뿐이란다.
“맹물을 붓고 간만 맞춰 먹어도 맛있는 건데 굳이 양념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충청도에선 이렇게 맑은 국물로 즐겨 먹죠.”
한편 민물새우를 탕으로 즐겨 먹는 또 다른 지역인 전북 임실 옥정호의 운암매운탕거리에서는 조금 다른 맛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선 우거지와 들깻가루를 넣어 걸쭉하고 진하게 끓여낸다.
대전=이연경 기자 world@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