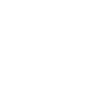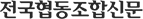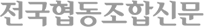찬바람이 옷깃 사이를 파고드는 계절이 오면 그리워지는 것이 있다. 모락모락 김을 내며 뜨끈뜨끈 몸을 데워주는 탕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탕’을 ‘국의 높임말’ 또는 ‘일반적인 국에 비해 오래 끓여서 진하게 우려낸 국물’이라고 정의한다. 재료가 무엇이든 넉넉히 물을 부어 푹 끓여낸 음식이다. 그러니 탕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이다.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 바다면 바다, 육지면 육지에서 제철을 맞아 탕으로 빛나는 것들이 있다. 동해의 오징어내장탕, 남해의 연포탕, 서해의 꽃게탕, 그리고 중부 내륙의 민물새우탕이다. 이 계절이 지나도 맛볼 수 있지만 이 계절에서야 최고인 제철 탕을 찾아가본다.
울릉도 토속음식 ‘오징어내장탕’을 아시나요?
오징어 말릴 때 배 갈라 내장 빼는데 먹을 것 귀한 시절 ‘정소’ 가져다 요리
선도 오래가지 않아 주산지서만 먹어
호박잎·무·콩나물 등과 함께 끓이면 국물 시원…내장은 부드럽고 고소
특별한 맛 아니지만 개운함에 ‘인기’
저동항·도동항 인근 식당 흔한 메뉴 제철 내장 냉동 … 언제든 먹을 수 있어

오징어내장탕, 이름 그대로 풀이하자면 오징어내장으로 끓인 탕이라는 뜻일 텐데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어떤 모습을 하며 어떤 맛을 내는 탕일까. 왜 지금까지 한번도 만나보거나 먹어볼 기회가 없었을까.
오징어내장탕은 경북 울릉군, 울릉도의 토속음식이다. 오징어를 말릴 땐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버리는데, 이 내장을 가져다가 탕을 끓여 먹었던 것이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이야기다. 울릉도 사람이라면 오징어 철에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준 오징어내장탕 한번 먹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흔했다. 선도가 만 하루도 가지 않는 오징어내장의 특성상 오징어 주산지에서나 먹을 수 있는, 울릉도에서나 먹었던 음식이다.
그렇다고 귀한 음식 취급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냥 두면 버릴 것을 가져다 음식으로 만들었으니, 가난한 어머니의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을지언정 ‘고급’은 아니었던 것이다. 심지어 식당에서 돈 받고 파는 음식도 아니었다는 것이 박일래 울릉수협 저동어촌계장의 설명이다.
“울릉도 사람들은 식당에서 안 사 먹어. 집에서 맨날 만들어 먹던 음식을 왜 나가서 사 먹어. 요즘 식당에서 오징어내장탕을 파는 데가 많은 건 다 관광객 때문이지. 소문이 나면서 다들 찾으니까.”
금어기가 끝나고 찬바람 부는 가을이 오면 오징어도 제철을 맞는다. 저녁나절 저동항 어판장 앞 포구에 빼곡히 들어선 오징어잡이 배에 눈부시게 빛나는 집어등이 하나둘 켜지면, 신호다. 오징어잡이가 시작된다. 밤새 망망대해에서 오징어를 잡은 배들은 새벽녘에 저동항으로 돌아온다. 한때는 200m에 달하는 어판장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이 매일매일 오징어로 가득 찼었다. 중국 어선, 수온 상승 등 여러 이유로 어획량은 크게 줄었지만 찬바람이 부는 이즈음 저동항 어판장의 주인공이 오징어임은 달라지지 않았다.
새벽 4∼5시, 크고 작은 오징어잡이 배들이 들어오면 어판장은 금세 ‘핫 플레이스(인기 장소)’가 된다. 오징어를 하역할 사람, 경매사, 중도매인, 그리고 오징어 배를 가를 여인네들로 붐빈다. 오징어는 쉬이 상하는 식재료라 산 채로 잡아둬도 이틀이면 죽기 일쑤다. 그래서 오징어를 부리는 어판장에서 바로 배를 가르는 것이다.
여인네들은 어판장 바닥에 앉아 수십년 제 손과 함께해온 칼을 쥐고 팔딱거리는 오징어 배를 가른다. 오징어 다리를 쥐고 칼날을 한번 휙 휘두르면 원통이던 오징어가 순식간에 평면이 된다. 하얀색 정소와 누런 내장은 뜯어 고무대야에 모은다.
따로 모은 내장 중 하얀색 정소가 바로 오징어내장탕의 주재료다. 이를 호박잎과 무·콩나물을 넣고 끓이면 된다. 국물은 시원하고 오징어내장은 부드럽고 고소하다. 특별한 맛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운해서 울릉도 사람들의 해장을 책임졌던 주인공이다.
집집이 ‘레시피’도 다르다. 고춧가루를 넣고 칼칼하게 끓여내거나, 된장이나 고추장을 넣기도 한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맑게 끓이는 집도 있다. 울릉도 토박이 정의진씨(39)의 기억 속 오징어내장탕에는 묵은지가 들어가 있다.
“저희 어머니는 묵은지를 송송 썰어서 함께 넣고 끓여주셨어요. 여름이면 호박잎을 넣고 끓여주셨죠. 어릴 때는 무슨 맛으로 먹나 했는데 지금은 시원한 맛이 좋아서 종종 먹어요.”

오징어내장탕은 이제 울릉도 저동항이나 도동항 인근 식당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메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오징어 철에만 내장탕을 팔던 식당들이 이제는 가을에 산 내장을 냉동해뒀다가 사시사철 내놓는다. 울릉도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소문 덕분에 찾는 외지인이 늘어서다. 일이 이렇게 되자 공짜이던 내장에도 값이 매겨졌다. ‘요즘엔 1킬로그램에 오천원’이라는 게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다.
울릉=이상희, 사진=김도웅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